지면, 결합구독자
e내일교육 구독자
정기구독 인증
구독자명
독자번호
정기구독 인증
* 독자번호는 매주 받아보시는 내일교육 겉봉투 독자명 앞에 적힌 숫자 6자리입니다.
* 독자번호 문의는 02-3296-4142으로 연락 바랍니다.
플러스폰 이벤트 참여
자녀성함
* 플러스폰 개통 시 가입할 자녀의 성함을 적어주세요(필수)
* 개통 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 또는 학부모가 대리 가입 가능)
참여하기
뒤로
피플&칼럼

글 김민아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3학년
kma00603@naver.com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수업과 EBS 강의로 공부했다. 내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충분했다.
그때의 나에게 필요했던 건 대입을 친절히 설명해줄 누군가, 먼저 겪어본 이의 이야기,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다’는 선례였다. 그때의 내가 궁금했고 나에게 필요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
용기를 북돋아준 학보사의 헬싱키 취재
나는 현재 대학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1년간 휴학 중이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았던 새내기의 옷을 벗고 사회 초년생이라는 다음 단계를 어깨너머로 지켜보는 시점이다. 처음 대학 캠퍼스에 발을 내디뎠던 5월이 잊히지 않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던 1학년 1학기, 과 동아리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 학교에 갔던 날이 기억난다. 정문에서 보이는 캠퍼스는 아름답다 못해 웅장했고, 연신 두리번거리며 학교로 들어섰다. ‘내가 진짜 여기 학생이라고?’
대학 생활은 과분함을 꼭꼭 씹어 삼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학교에는 온갖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단기로 식당을 운영하는 동생,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더니 방송에 출연한 동아리 친구들, 반려동물 앱을 만들고 창업에 뛰어든 동기까지. 그들 곁에 있다 보니 나도 혼자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벌일 수 있었다.
교내 학보사에서 1년 반 동안 취재 기자와 편집 부국장으로 활동할 때 다녀온 헬싱키 취재가 그 연장선이다. 어느 날 해외 취재 선발 공고가 올라왔다. 여행도 아닌 취재를, 외국인과 대화가 아닌 인터뷰를 해야 한다니 나에겐 가당치 않은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동기들의 대범함이 전염됐는지 너도 나도 지원하는 그들을 보며 고민 끝에 용기를 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 마음이 맞는 동기와 ‘핀란드 헬싱키의 중고 문화와 그린 캠퍼스’를 주제로 기획안을 작성해 제출했고 기회는 결국 나에게 왔다.
헬싱키에서 보낸 11일 동안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했다. 쾌청한 날씨와 늦은 일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는 핀란드 사람들. 순간의 행복보다 값어치 있는 건 새로운 마음가짐이었다. 핀란드를 다녀오니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기 때문이다.
도전과 새로움의 연속인 독일 생활
지금은 방문 학생 자격으로 독일에 와 있다. 방문 학생은 대학이 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교환 학생과 달리, 학교의 도움 없이 준비해 유학을 떠난 학생을 말한다. 입학부터 거주지까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이화여대 학생은 방문 학생으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흔하다.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옛날이라면 까마득했을 일이 이제는 덤벼볼 만한 일이 됐다. 짧았던 핀란드 취재의 아쉬움과 뿌듯함이 유학 고민을 부추기기도 했다. 모든 게 새로웠던 유럽에서 6개월간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겨 여기까지 왔다.
독일에서 지내는 요즘은 여전히 크고 작은 도전과 새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룹 프로젝트로 기업 CEO를 인터뷰해 기업가 정신을 재정립하는 세미나 수업을 듣는데 팀원 5명의 국적은 러시아, 폴란드, 방글라데시 등 다양하다. 영어로 소통하지만 각자의 억양과 발음이 달라 소통이 쉽지 않고 협업 방식도 낯설다. 팀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1인분의 몫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캐나다의 한 마을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지내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친구를 떠올린다. 그도 이런 난관에 부딪혔겠지, 이런 감정을 느꼈겠지 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게 만드는 힘이 있다. 발버둥치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그 경험이 또 다른 새로움에 뛰어들 용기를 북돋운다.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를 만드는 재료로 쓰일 테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나만의 우물을 넓히는 중이다.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아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3학년) kma00603@naver.com
- 2025 공신들의 NEW 진로쾌담 (2025년 07월 02일 11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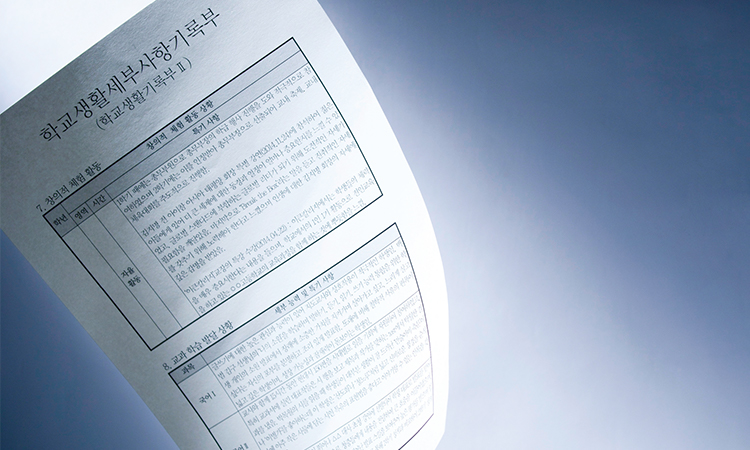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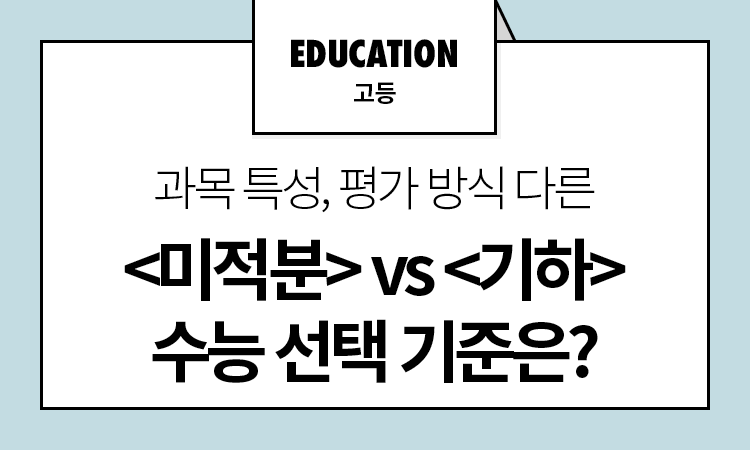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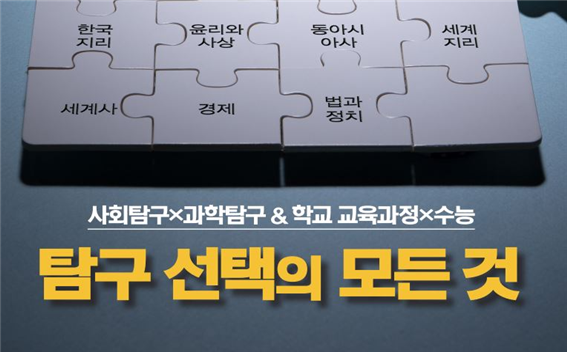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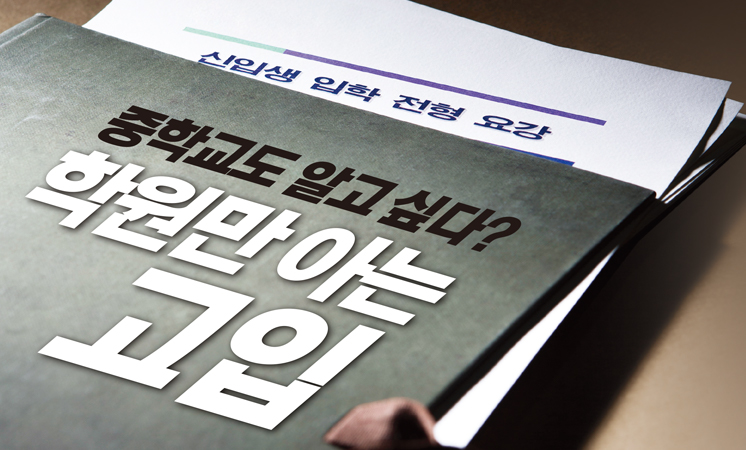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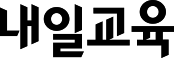
댓글 0
댓글쓰기